[인디언밥 9월 레터]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연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연서
안녕하세요! 어쩐지 격월로 찾아오고마는 인디언밥 레터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다기엔 저는 조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직 다 죽진 않았다니 기쁜 일일까요?
지난 달엔 이랑 작가의 3집 <늑대가 나타났다>를 오래 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하는 노래는 강렬했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을 외칠 땐 무키무키만만수의 <방화범>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이라며 소리치면 <도시산책론 : 도시투어 1. 서울의 미로>에서 만난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너도 부자되지 않았을텐데'같은 문구도 생각났어요. 그녀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남기고 우화를 빌려 이 노래들을 ‘잘 듣고 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고 외쳐요. 그러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합창은 고함이 되고 절규가 되며 막을 내립니다.

언젠가 친구와 인류의 끝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경파라서 다같이 카운트 다운을 하고 환한 빛속으로 빨려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고, 친구는 온건파라서 어느날 이후로 모두가 출산을 안 해서 끝을 맞이하길 바랐습니다. 버텨내는 삶에 진절머리를 내면서도 그냥저냥 살아가던 즈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은 무슨-그냥 그 친구와의 관계만 종말을 맞았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문득 그 친구는 이랑을 닮았고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에게 ‘내 귀한 사람들아'라며 호명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연서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세상, 쉽게 지워지는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란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삶을 고통으로 칠하는 것들을 노려보고 돌을 들어보는 것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슬픔인지는 거대한 삶의 무게 앞에 때로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땐 너를 괴롭게 하는 것에 함께 몸을 부딪히고 아파하다가 차라리 멸망을 꿈꾸게 되는 거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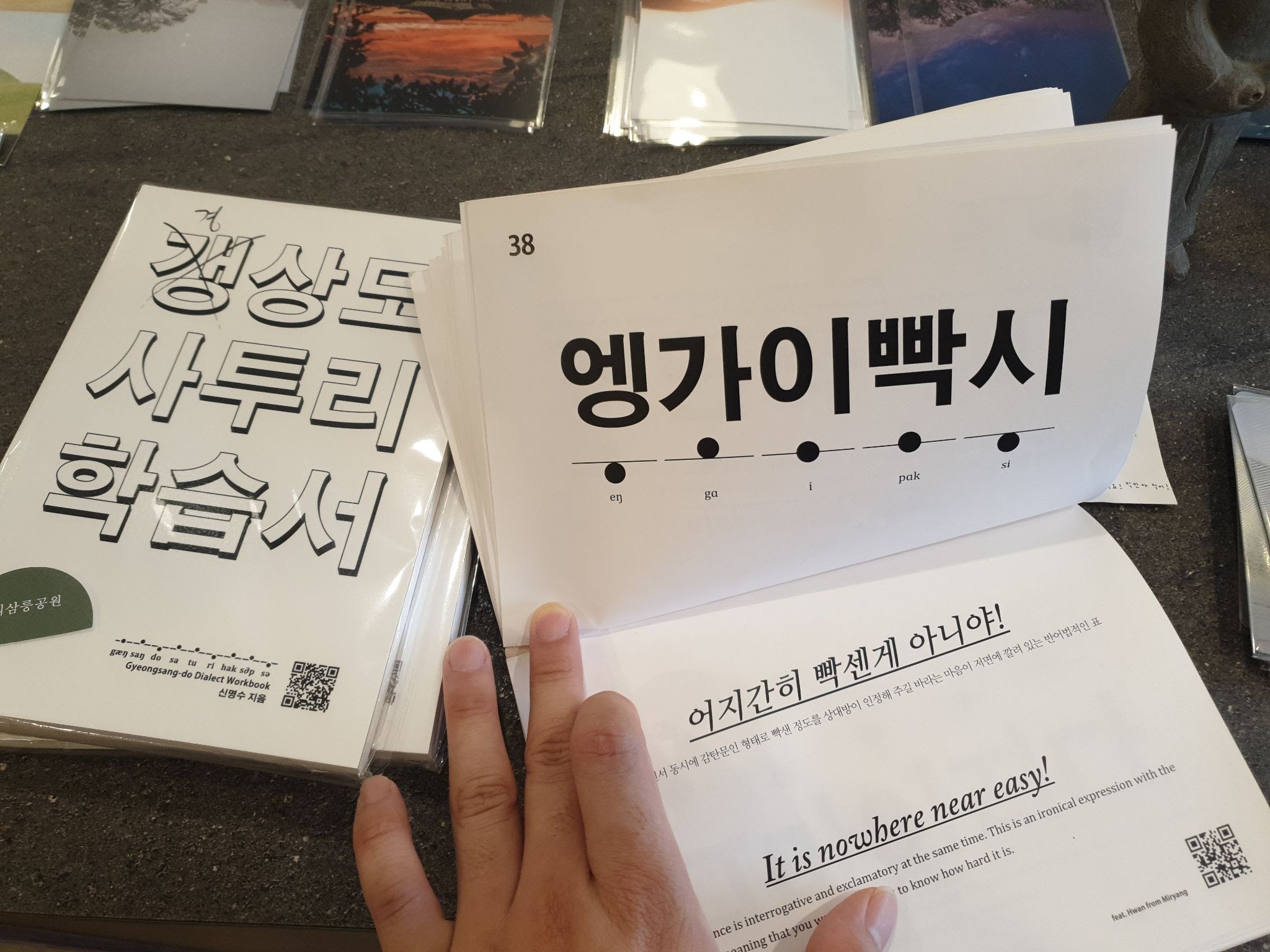
아아 삶이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몇 달을 쏟아부은 공연이 엎어져도 삶이 계속되고, 더 긴 시간을 애쓴 축제가 엎어져도 해야할 일은 남는데, 축제가 엎어지는 대신 공연을 취소시키면서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건 얼마나 우습습니까. 오늘 트위터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으로 뜨겁고, tv에선 명절을 맞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나오고, 저희 집은 그냥 롯데자이언츠의 경기력이 최대 화젯거리입니다.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그 평화가 수치스러운 밤입니다.
볕을 충분히 쬐고 세상을 저주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벌써 새벽 4시입니다. 취소된 공연은 상영회로 바뀌어 다시 준비할 게 생겼고, 연기되어 열릴 축제를 위해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제 노래와 축제를 위해 뭐라도 하고 자야겠지요. 희망차게 레터를 마치기엔 어려울 모양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게 글러먹었다고 함께 화를 내봅니다. 오늘은 내 귀한 사람들을 함께 떠올려보겠습니다.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편집위원
김민수